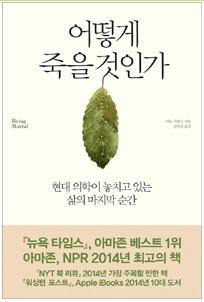
지은이 아툴 가완디 지음,
김희정 옮김
펴낸 곳 부키
가격 16,500원
“죽어 간다는 건 우리의 생물학적 제약에 대처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이다. 유전자와 세포와 살과 뼈가 가진 한계 말이다. 의학은 이 한계를 뒤로 밀어붙일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나는 의학의 힘이라는 게 무척 제한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피해를 너무도 많이 목격해 왔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죽는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누구나 가능한 한 오래 살기를 꿈꾼다. 수술을 비롯한 각종 의학적 처치들도 죽음을 미루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저자이자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아툴 가완디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과연 죽음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끔찍한 의학적 싸움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어 우리가 노쇠해지거나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취할 수 있는 ‘인간답게 죽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저자는 자신이 만난 말기 환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의사였던 저자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일화에서 덤덤하게 다가오던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비로소 떨림으로 다가온다.
이어 저자는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개별적인 문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삶의 마지막 단계를 환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의식 변화도 촉구한다. 부제인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각자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