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올 3월 집을 나와서 이 사무실에 텐트를 치고 지내며 연을 연구 중이다. 어릴 적 고향인 거제에서 시작한 연놀이부터 현재의 고향인 부천의 연 전문가로 입지를 굳히기까지의 인생역정을 성 옹에게 들어봤다.
통영 곤리도에서 맺은 연과의 인연
“팥죽 먹는 동지 때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우리 섬은 연 천지로 변했어요.”
성용부 옹은 경남 통영 곤리도에서의 아홉 살 시절을 기억한다. 그 때는 150여 호 섬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연을 날렸다. “나이가 어렸어도 어른들만 출전했던 연 날리기 대회에 나갔어요. 1등도 하고 2등도 했는데 선물은 막걸리였지요. 그 날은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나 술을 나눠 먹으며 동네잔치를 벌였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손재주가 많았다. 또 20대 청년들과 겨뤘던 대회에서 유난히 연을 잘 띄웠다고 회상한다. 섬에서 놀던 연에 대한 정서는 그렇게 그의 인생에 깊숙이 자리잡게 된다. 성장기는 파란만장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6.25동란이 일어났고, 집안 사정으로 헤어진 어머니를 만나 거처를 옮겼다. 16세부터는 마도로스 생활도 했고 서울 명동에서 양화점 직원으로 일했다.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어요. 독학을 시작했죠. 그렇게... 스물넷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연줄 끊으며 한(恨)을 날려 보내
“다시 연을 만난 건 결혼하고 체육관을 운영할 때였어요.” 서른셋에 부천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1985년, 라디오에서 연 날리기 대회 소식을 들었다. 무조건 참가했다. 첫 출전에 패했고 그러면서 9년이 흘렀다. “나일론실에 본드를 묻힌 연 실 때문에 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명주실을 써서 다시 연을 만들었지요.” 1995년 수원에서 열린 전국 연날리기대회에 참가했다. 장려상을 받았다. 시골 개구쟁이들이 연줄을 끊던 밑치기 기법을 발휘하여. 이 대회를 기점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연줄 끊는 방법을 늘 고민하며 살았다. “그 때부터 발전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연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 뒤 우리나라 연날리기 대회에서 성용부라는 이름은 매 번 불려졌다. “제가 연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의 연줄을 끊을 때 느끼는 쾌감이 살면서 묻어버린 한과 우울함을 날려주기 때문입니다. 연은 멋있고 매력적인 상대로 제 곁에 살아있어요.”
연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연 날리기는 정월대보름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적어 날리면 그 해의 액운이 날아가고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풍습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 대 초까지 연날리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스포츠가 됐다. 현재 통영, 광주, 진주, 인천, 서울 등에는 전국적인 연 동호회가 있다.
성 옹은 연 특허권자이며 발명가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전통연 특선작가이고 러시아 하바로브스키시 세계 연날리기 대회 등에서 입상했다.
그는 부천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연을 선보인다. 그렇게 전통연을 보존하고 계승하면서 제자들을 길러왔다. 인터뷰 시간에 제자인 최상석 씨가 찾아왔다. 최 씨는 “연을 재단하고 연살 깎기법을 배우고 있다. 성 선생님은 연을 너무 잘 아시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현재 그의 공방은 문을 닫고 있다. 작년 3월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간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 사람의 병세가 호전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성용부식 기법으로 독창적인 연을 만들려구요. 그리고 우리 부천에 연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 성용부 옹은 2010년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관화민간화를 전공했고 2011년 제 8회 개인전을 열었다. 그는 ‘황혼에 핀 무지개(2003)’, ‘문학과 연의 만남(2008)’에 소개돼 있다.
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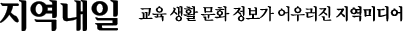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