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8만 장애인의 꿈은 자립생활”
활동보조인 서비스사업으로 이동권 지원 … 복지택시 늘이고 지역이동제한 풀어야

길거리에 장애인이 많아졌다
“전동휠체어!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제도! 이 둘이야말로 장애인들에겐 혁명이나 마찬가지다. 원하는 곳을 최소한 이동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길에서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비장애인들처럼 자립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자 목표다.”
이 말을 들려준 사람은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용현 소장이다. 올해 나이 50세, 중년으로 향하지만 아직도 중증장애로 인한 물리치료는 끝날 줄 모른다.
박 소장은 사람들과 만나면 먼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한다. 기본 상식과 예의, 그렇게 되기까지 적지 않는 세월이 자리한다.
박 소장은 “중증장애인들은 대부분 집안이나 시설에서 생활한다. 특히 중증은 몸의 경직과 운동신경마비증상이 심하다. 몸이 뻗히고 오그라드는 모습. 사람들이 피하고 장애인들이 위축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언제까지 고립무원의 은둔생활을 반복할 것인가. 가족은 또 무슨 죄인가. 게다가 장애인보호시설에 의지하는 독신 중증장애인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박 소장이 센터를 만든 절실한 이유다.
여의도 1달 반을 몸으로 기어 만든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박 소장에겐 운명을 같이해온 두 명의 소중한 동반자가 있다. 2004년 센터 설립 초창기 멤버 황철주 전 센터장과 공소규 현 부소장이다. 세 사람에게 지난 2006년은 눈물 없인 떠올릴 수 없는 감동해로 기억된다.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권리는 이동권이다. 중증은 죽을 때까지 사람이 있어야 화장실을 간다. 움직이기 위해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약 없는 장애의 삶. 사회 소수자로서 투쟁했다”며 “여의도에서 1달 반을 몸으로 싸운 결과 탄생한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은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맞바꾼 결과”라고 회고한다.
장애인에게 법통과는 엄청난 삶의 변화다. 장애인이 이동할 때 정부에서 고용한 보조인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비록 월 100시간 내외지만. 센터의 주 사업도 여기 있다. 활동보조인은 유료로 장애인들을 보조한다. 사회적 일자리 형태다. 부천시에선 이곳 센터와 함께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원미자활후견기관에서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를 맡고 있다.
박 소장은 “센터에서는 부천시내 활동보조인을 모집해 교육하고 활동시간 당 시급 80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들이 신변처리와 가사지원 그리고 이동지원이 주 업무다.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급 중증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로 나가는 첫 단추 ‘나를 존중하기’
박 소장이 이끄는 센터의 사업은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 외에도 동료상담과 자립생활지원,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이다. 그중에서도 동료상담은 센터가 기울이는 주요사업이다. 장애인의 사회진출에 첫 단추인 ‘용기와 자존감 찾기’를 위해서다.
“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가 폐쇄성이다. 그래서 동료상담에서는 억압된 감정을 해방하고 마음의 고민을 동료 입장에서 풀어낸다. 이곳의 고 부소장처럼 전문상담 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전문상담가들이 이 과정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현주소는 아직도 밝지만은 않다. 부천시내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0%. 이중 일반 장애인 수는 약 5만 명. 1급 중증장애도 2만 명이 넘어 적지 않다. 그래서 시 인구수 비례 장애인 지원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게 박 소장의 생각이다.
박 소장의 설명이다. “광주나 인천 등 타 지역에 비해 부천시는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이용 시간이 적다. 독거나 중증 장애인에게 해당하는 특례 혹은 추가서비스 혜택을 예산부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천시는 경기도 중 제일 많은 장애인이 사는 도시인 반면, 장애인콜택시 수는 고작 8대에 불과하다. 8만 장애인을 위한 공용교통수단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박 소장의 소망은 작고 소박하다. ‘나쁜 짓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는 가슴 아픈 편견들이 사라지는 날, 누구나 센터에 들러 즐겁게 커피 한잔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친구 하는 그런 날, 그 희망을 꿈꾸며 일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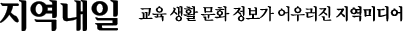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