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번 달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도서관에서 상식철학을 강의합니다. 첫 강의의 제목은 ‘상식철학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상식철학은 시민들의 철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철학입니다. 올바른 상식과 잘못된 관행(통념)을 구분하고, 건강한 상식을 세워 지키자는 주장입니다. 당연한 말이라서 모두들 쉽게 공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저런 의문들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김영란법은 상식에 맞는 걸까요?” “여성철학이 있다면 남성철학도 있는 건가요?”
우리는 학교에서 좋은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그런 내용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윤리는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정치와 사회의 기본 원리이지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텐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두들 지쳐서 더 이상 공부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은 합리적인 원리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도 미신적인 전통이나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2강은 상식철학과 한국사회 현실이 주제였습니다. 한국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일까요? 그랬다면 나는 굳이 상식철학을 주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벌써 오래 전부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식철학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타이틀을 걸었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은 상식의 범위 내에 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행복이지, 완벽한 행복은 없다고 말합니다. 몰상식과 비상식의 늪에서 빠져 나오면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그때 느끼는 행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상식철학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 삶을 얘기할 3강과 공감의 새로운 공동체를 소개할 4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함께 하는 인문학 공동체
강의를 들으러 온 분 중에는 철학을 모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문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왜 철학을 강의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철학책을 많이 읽은 분도 있었지만, 제가 보여준 철학자 다섯 사람을 모두 다 아는 분은 없었습니다. 인문강좌나 철학 강의가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무얼 들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몇 번 듣다보면 그게 그거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나의 강의는 수강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시도 한 편 감상하고 동영상도 보게 됩니다. 내 책 내용을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토론식 강의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상식철학을 전문철학과 대비시킵니다. 사람들이 철학이 어렵다고 말할 때는 철학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철학은 소수의 철학자들이 하면 됩니다. 물론 그들도 먼저 상식철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과 유리된 철학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에 대해 공부하겠다면서 몇 권의 전문영역 책을 읽고는 실망합니다. 또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생동안 함께 하게 되는 철학은 삶의 의미이고 깊이입니다. 우리는 상식에 머물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상식조차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장하준 교수는 그의 책에서 경제학 이론의 95%가 상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지만 동시에 상식철학자입니다.
인문강좌에서 얻는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좋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상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제 소설가 조정래 초청 강연회에 수백 명의 청중들이 대강당을 꽉 채운 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충청인들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인문학이고 공동체입니다.
김 의 수(전북대 명에교수. 독일현대철학)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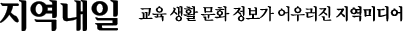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