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플라톤이 나왔어요!”
“강쌤, 국어시험에 플라톤 나왔어요.”
?모의고사를 본 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합니다. 확인해보니 소피스트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적 흐름을 개괄한 지문이더군요.
여하튼 <철학입문> 수업에서 자연철학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자세히 다루던 차였고, 수업 중 ‘지금 배우는 거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닌 건 알지?’라고까지 했으니 본의 아니게 ‘작두 탄 족집게’가 되어 버린 셈.
그 주에는 이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쌤, 데모크리토스가 영어 수능교재에 나와요. 짱 신기해.” “오호~ 그거 모레 할 건데, 예습 좀 했나봄? 어쨌거나, 선생님 얘기 거짓말 아닌 건 확실하지?”
고등과정에서 인문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대학가서 배우면 되지. 고등학교 때는 입시에 몰두해야 하는 거 아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본격적인 학문탐구를 대학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준비를 하는 것이 고교과정인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 준비 정도를 여러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입시구요.”
수능문제의 상당부분이 인문학적 내용인 것도 같은 이치. 오죽하면 제가 농반 진반으로 수능교재는 훌륭한 인문학 교재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목적과 수단이 자리를 바꿀 때입니다. 출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인 학문탐구 이전에 준비돼있어야 할 부분’에서 문제를 냅니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문을 수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테스트’니까요.
다양한 직간접적 체험과 교양학습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주는 일과 그렇게 받아들인 소양을 시험방식에 맞게 연습하는 일은 양립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닙니다. 전자는 전자답게 후자는 후자답게, 교육과정에서 녹여내야 할 ‘한 토끼의 두 양태’인 거죠.
그런데도 한 마리를 두 마리라고 우기는(?) 이유는 아마, 무리하게 나눈 반 토막 중 어느 한 쪽을 포기하고 싶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일 겁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사회의 조급증에, 저마다의 소양을 세밀하게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 상의 능력부족이 겹치면서 ‘교육’이라는 애꿎은 토끼만 동강난 겁니다.
작년 수능 국어시험에는 폴라니, 재작년에는 칸트, 그리고 그 전해에는 비트겐슈타인이 등장했습니다. 모두 철학수업에서 가르쳤던 내용인데요. 논술, 영어까지 포함하면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흠…, 그래서 생각해본 건데, 철학수업 제목을 <수능대비 철학특강>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강현석 (번역가, 우리들학교 대표교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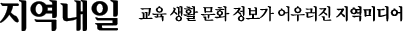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