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섭이 인생을 두고 승부를 걸었던 핵심적 도서관 운동은 농어촌 마을에 조그마한 문고를 설치한 뒤, 주민이 이를 이용하며 키워나가도록 지도하는 사업이었다. 그는 조속한 기간에 전국 3만5000여 행정구역에 문고설치를 완료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문고 지도 전담조직 건설, 지도자 교육 강화, 읽기 쉬운 농업도서 출판 배포 등 질적 육성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육성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1980년대 초반 재정 위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체제에 통합됨으로써, 엄대섭은 인생의 꿈을 중도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부실한 문고가 양산돼 1980년대 중반 수천 개로 통폐합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용남 선생은 "'문고를 먼저 설치한 후 질적 도약을 이룬다'는 그의 거대한 전략이 무산돼 버린 상황은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엄대섭은 문고운동이 공공도서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우리의 열악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음을 줄곧 표방했다. 공공도서관이 각 지역의 마을문고를 하부구조로 연계하거나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공공도서관망'을 형성해 마을 단위 최일선의 소분관 또는 봉사 거점으로 활용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문고운동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시도하기에는 그 기반이 취약했고, 재정 위기의 반복으로 기회를 살릴 수 없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설립사업 역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가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당시의 운동이 얼마나 힘에 부쳤을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항구적 재원확보를 위한 몸부림과 그 좌절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정부의 역할을 개인이 대신함으로써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임대섭은 항구적 기금 마련이 수차례 좌절되자 "200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지방정부에 기증한 앤드루 카네기 같은 재벌이 왜 우리에겐 없는가" 하며 "이럴줄 알았으면 옛날 한창 돈벌이가 될 때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두었어야 했는데…"라고 한탄했다 한다.
하지만 과연 그같은 절규가 온전히 그만의 아픔으로 남은 것은 현 시점의 우리가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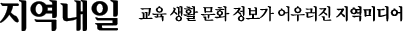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