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옛날 '덕석('멍석'의 방언)말이'라는 것이 있었다. 동네 어귀 느티나무 앞에서 마을의 체면을 깎아내리거나 나쁜 짓을 한 이웃에게 마을의 가장 어른이 벌을 주는 것인데, 당시에는 법보다 마을의 징계를 더욱 무서워했던 것 같다. 반면 이웃이 어려울 땐 '좀도리('節米'의 방언)'라 하여 쌀이나 수수를 조금씩 모아 도움을 주는 긍휼(矜恤)제도도 있었다. 이렇게 동네 이웃의 옳지 않는 면을 나무랄 수도 있고, 어려울 땐 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근간은 주민들이 부대끼며 살고 있는 곳이 하나의 공동체, 즉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마을'은 끈끈한 정이 묻어나는 단어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각박한 도시에서 고독과 불안의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마을'이 아닐까 한다. 도시 생활에서 사람과 이웃이 중심이 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그래서 중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마을 만들기를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민자치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마을에 필요한 것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
동주민센터 명칭이 '동민의 집'에서 '자치회관'까지 오는 데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미 그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활동이 여전히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그 사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 사업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이다. 마을에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 이를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추진하기만 한다면 공무원들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더욱 훌륭하고 알뜰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성동구 주민자치에도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다. 허브농장 운영, 작은도서관, 야쿠르트배달을 통한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재활용 판매장 운영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중이다. 특히 자랑할만한 것은 지난 2011년 17개 모든 동에 구성된 동별 풀뿌리 장학회이다. 기존 관에서 주도했던 장학사업을 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1만원, 2만원씩 적은 돈이지만 주민 스스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직접 동네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백만원의 거금을 한 두 번 내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꾸준히 보태며 어려운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마을사업에 지속성이 부여된다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운영과정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기획-집행-수익창출-평가의 전 과정을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주민자치사업 모델이 완성된다면, 현재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사업은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려 한다. 그러면 동 직원들은 많은 시간을 발로 뛰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방문하는 맞춤형 현장 복지행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델의 확립을 위해 성동구는 동주민센터를 더욱 정겹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행정공간이야 한층이면 되고, 나머지 서너개층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현재 왕십리 도선동 주민센터를 건립중인데, 각 층별로 행정공간, 어린이집, 도서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동네 사랑방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노인시설의 경우 주민자치사업으로 운영시 동별 10명씩만 수용해도 구 전체로 200여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고 참여하며,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실현 가능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온전히 기르기 위해선 지역사회, 이웃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처럼 '좋은 마을'이란 마을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정을 나누는 '좋은 이웃'이 많은 곳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옛날 '덕석('멍석'의 방언)말이'라는 것이 있었다. 동네 어귀 느티나무 앞에서 마을의 체면을 깎아내리거나 나쁜 짓을 한 이웃에게 마을의 가장 어른이 벌을 주는 것인데, 당시에는 법보다 마을의 징계를 더욱 무서워했던 것 같다. 반면 이웃이 어려울 땐 '좀도리('節米'의 방언)'라 하여 쌀이나 수수를 조금씩 모아 도움을 주는 긍휼(矜恤)제도도 있었다. 이렇게 동네 이웃의 옳지 않는 면을 나무랄 수도 있고, 어려울 땐 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근간은 주민들이 부대끼며 살고 있는 곳이 하나의 공동체, 즉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마을'은 끈끈한 정이 묻어나는 단어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각박한 도시에서 고독과 불안의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마을'이 아닐까 한다. 도시 생활에서 사람과 이웃이 중심이 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그래서 중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마을 만들기를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민자치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마을에 필요한 것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
동주민센터 명칭이 '동민의 집'에서 '자치회관'까지 오는 데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미 그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활동이 여전히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그 사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 사업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이다. 마을에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 이를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추진하기만 한다면 공무원들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더욱 훌륭하고 알뜰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성동구 주민자치에도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다. 허브농장 운영, 작은도서관, 야쿠르트배달을 통한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재활용 판매장 운영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중이다. 특히 자랑할만한 것은 지난 2011년 17개 모든 동에 구성된 동별 풀뿌리 장학회이다. 기존 관에서 주도했던 장학사업을 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1만원, 2만원씩 적은 돈이지만 주민 스스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직접 동네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백만원의 거금을 한 두 번 내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꾸준히 보태며 어려운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마을사업에 지속성이 부여된다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운영과정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기획-집행-수익창출-평가의 전 과정을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주민자치사업 모델이 완성된다면, 현재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사업은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려 한다. 그러면 동 직원들은 많은 시간을 발로 뛰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방문하는 맞춤형 현장 복지행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델의 확립을 위해 성동구는 동주민센터를 더욱 정겹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행정공간이야 한층이면 되고, 나머지 서너개층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현재 왕십리 도선동 주민센터를 건립중인데, 각 층별로 행정공간, 어린이집, 도서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동네 사랑방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노인시설의 경우 주민자치사업으로 운영시 동별 10명씩만 수용해도 구 전체로 200여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고 참여하며,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실현 가능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온전히 기르기 위해선 지역사회, 이웃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처럼 '좋은 마을'이란 마을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정을 나누는 '좋은 이웃'이 많은 곳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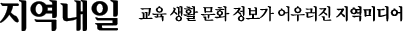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