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료 스마트폰으로 전국민에 제공”
국립도서관은 국가의 자존심 ...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
“‘추노’에 대해 알고 싶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오면 조선시대 노비제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주문형 자료를 제공한다. 검색 순위가 높은 정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별도로 모아 문서와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자료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철민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드라마 ‘추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조선시대 노비 관련 자료를 주제별로 모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며 “또한 모아진 주제별 정보를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도서관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은 지난해 5월 개관한 이후 40만점 정도의 디지털화된 자료를 축적했다. 그리고 매일 1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면서 미디어 도서관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모 관장은 국립도서관이 시대의 변화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국가의 서지(문헌목록)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국민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립도서관의 빼 놓을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모 관장은 “도서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이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은 정보소외계층을 없애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국 도서관과 연계한 사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명, 도서관의 선택은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작은도서관은 소장 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디지털 자료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들 도서관에 소장한 자료를 공급해 국민들의 정보 양극화를 줄이는데 올해 최우선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경북 칠곡군에 첫 자료교류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도서관 소장 자료는 1000권에 불과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과 디지털 교류로 이 곳에서 30만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 관장은 “지역 도서관의 자료라고 해봐야 몇 권 안되고, 분류도 제대로 안된 곳이 많다”며 “중앙도서관에서 서버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에서도 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 관장은 특히 도서관도 디지털 혁명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그래서 얼마전 ‘스마트 폰’을 구입했다. 전 국민이 공유할 스마트 폰에 도서관 자료를 제공하면 정보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국민들 사이에도 정보 격차가 엄청났다.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사회적 위치도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해서 시골까지 전달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을 국가의 자존심으로
지난해 5월 국립중앙도서관을 맡은 모 관장은 종이책 장서와 디지털 장서 구입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전략과제는 지난해 세계국립도서관장 회의에서 나온 주제이자 전 세계 도서관의 고민거리기도 하다.
특히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면서 서지 정보를 구축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또 다른 세계를 고민한다. 모 관장은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한국형 도서 보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도서관 본연의 임무는 역시 서지정보 구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160명의 역할이 서지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모 관장은 서지정보 구축만은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에 전문 사서 33명을 뽑아 ‘국가서지정보센터’에 투입했다. 국립도서관이 지킬 수 있는 자존심이 여기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 관장은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 역시 도서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는 프랑스나 영국의 국립도서관의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는 국립도서관이 카사노바의 일기를 100억원을 들여 사왔다. 그들은 그것이 문화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1년 책 구입 예산이 30억원이다.”
모 관장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립도서관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다. 국민들의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국립도서관의 역할에 달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립도서관은 국가의 자존심 ...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
“‘추노’에 대해 알고 싶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오면 조선시대 노비제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주문형 자료를 제공한다. 검색 순위가 높은 정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별도로 모아 문서와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자료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철민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드라마 ‘추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조선시대 노비 관련 자료를 주제별로 모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며 “또한 모아진 주제별 정보를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도서관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은 지난해 5월 개관한 이후 40만점 정도의 디지털화된 자료를 축적했다. 그리고 매일 1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면서 미디어 도서관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모 관장은 국립도서관이 시대의 변화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국가의 서지(문헌목록)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국민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립도서관의 빼 놓을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모 관장은 “도서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이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은 정보소외계층을 없애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국 도서관과 연계한 사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명, 도서관의 선택은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작은도서관은 소장 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디지털 자료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들 도서관에 소장한 자료를 공급해 국민들의 정보 양극화를 줄이는데 올해 최우선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경북 칠곡군에 첫 자료교류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도서관 소장 자료는 1000권에 불과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과 디지털 교류로 이 곳에서 30만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 관장은 “지역 도서관의 자료라고 해봐야 몇 권 안되고, 분류도 제대로 안된 곳이 많다”며 “중앙도서관에서 서버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에서도 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 관장은 특히 도서관도 디지털 혁명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그래서 얼마전 ‘스마트 폰’을 구입했다. 전 국민이 공유할 스마트 폰에 도서관 자료를 제공하면 정보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국민들 사이에도 정보 격차가 엄청났다.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사회적 위치도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해서 시골까지 전달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을 국가의 자존심으로
지난해 5월 국립중앙도서관을 맡은 모 관장은 종이책 장서와 디지털 장서 구입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전략과제는 지난해 세계국립도서관장 회의에서 나온 주제이자 전 세계 도서관의 고민거리기도 하다.
특히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면서 서지 정보를 구축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또 다른 세계를 고민한다. 모 관장은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한국형 도서 보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도서관 본연의 임무는 역시 서지정보 구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160명의 역할이 서지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모 관장은 서지정보 구축만은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에 전문 사서 33명을 뽑아 ‘국가서지정보센터’에 투입했다. 국립도서관이 지킬 수 있는 자존심이 여기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 관장은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 역시 도서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는 프랑스나 영국의 국립도서관의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는 국립도서관이 카사노바의 일기를 100억원을 들여 사왔다. 그들은 그것이 문화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1년 책 구입 예산이 30억원이다.”
모 관장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립도서관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다. 국민들의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국립도서관의 역할에 달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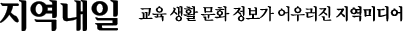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