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기 때마다 도서관정책 통해 극복 … 우리는 '생색내기' 그쳐
"문화대국을 말하면서도 정부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살리기보다 서자격인 작은도서관만 열심히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서관을 계륵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먹자니 싫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처럼…. 공공도서관을 제대로 만들려면 돈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투입 대비 산출이 정량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버리자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입국, 독서하는 나라 만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기도 어렵고…. 한마디로 문화를 보는 인식이 없는 것이죠. 현 박근혜 대통령도 문화융성을 앞세웠습니다. 도서관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도서관인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의 말에는 시퍼런 날이 서 있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제49회 도서관주간이 예정돼 정신없이 바쁜 그이건만, 도서관을 대하는 정부의 입장에 마냥 속이 타는 상황이다.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정부와 정치권의 도서관 홀대 =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도서관인 모두 '이제는 제대로 된 도서관 정책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MB정부에서 위원회를 홀대하는 걸 보며 '임시위원회인 커미티(Committee)가 아니라 인권위원회 같은 상설기구 커미션(Commission)이 됐어야 했는데…' 하며 안타까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전부 정리한다는 소리마저 들리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았기에 일말의 기대는 붙잡고 있습니다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 회장이 거론한 정부와 정치권의 도서관 홀대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의 목소리가 격정으로 떨리기까지 했다.
"미국의 경우 20년 이상 한 곳의 도서관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 연륜이 담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을 도서관장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도서관의 예를 보면 우리의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법처인 국회의 내로라는 임명직은 모두 여당 몫이고, 야당에 선심쓰듯 딱 하나 양보하는 게 국회도서관장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떤가요. 은퇴를 앞둔 고위공무원이나 승진서 밀린 공무원이 가는 곳이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나 정치권의 도서관 인식 수준입니다.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부총리급이나 장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든지, 아니면 나라 안팎에서 크게 인정 받는 석학을 모시든지 해야 합니다."
◆대공황과 스푸트니크 쇼크 = 지금 우리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들 분석한다. 부동산 침체에 수출은 안 되고, 정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남 회장은 미국 도서관의 부흥기를 보라고 말했다. 위기를 헤쳐나가는 미 정부의 전략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 정부가 택한 방법은 바로 도서관 진흥이었다. 대표적 두 사례가 바로 1930년대 대공황과 1957년 스푸트니크 쇼크다.
"대공황때 미국에 실업자가 양산됐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역경을 딛기 위해 도서관으로 모였고, 이를 본 미 정부는 예산을 대폭 늘려 도서관을 짓고, 질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지식을 얻고,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이 희망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민은 대공황을 극복해 냈습니다."
북핵으로 인해 안보 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는 현 상황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선례를 보면 된다. 1957년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미국 내 안보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미 정부가 택한 방법은 바로 학교도서관 진흥이었다. 미국 내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이어졌고, 곧바로 교육 현장이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행정 체제와 법제 정비에 돌입했다. 바로 '스푸트니크 쇼크'의 시작이다. 이듬해인 1958년 미국은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학교도서관을 위한 연방자금 지원 근거 마련 등에 나섰다.
"빌 게이츠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바로 내가 살던 마을의 공공도서관'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없는 까닭을 반드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문화대국을 말하면서도 정부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살리기보다 서자격인 작은도서관만 열심히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서관을 계륵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먹자니 싫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처럼…. 공공도서관을 제대로 만들려면 돈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투입 대비 산출이 정량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버리자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입국, 독서하는 나라 만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기도 어렵고…. 한마디로 문화를 보는 인식이 없는 것이죠. 현 박근혜 대통령도 문화융성을 앞세웠습니다. 도서관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도서관인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의 말에는 시퍼런 날이 서 있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제49회 도서관주간이 예정돼 정신없이 바쁜 그이건만, 도서관을 대하는 정부의 입장에 마냥 속이 타는 상황이다.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정부와 정치권의 도서관 홀대 =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도서관인 모두 '이제는 제대로 된 도서관 정책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MB정부에서 위원회를 홀대하는 걸 보며 '임시위원회인 커미티(Committee)가 아니라 인권위원회 같은 상설기구 커미션(Commission)이 됐어야 했는데…' 하며 안타까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전부 정리한다는 소리마저 들리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았기에 일말의 기대는 붙잡고 있습니다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 회장이 거론한 정부와 정치권의 도서관 홀대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의 목소리가 격정으로 떨리기까지 했다.
"미국의 경우 20년 이상 한 곳의 도서관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 연륜이 담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을 도서관장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도서관의 예를 보면 우리의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법처인 국회의 내로라는 임명직은 모두 여당 몫이고, 야당에 선심쓰듯 딱 하나 양보하는 게 국회도서관장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떤가요. 은퇴를 앞둔 고위공무원이나 승진서 밀린 공무원이 가는 곳이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나 정치권의 도서관 인식 수준입니다.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부총리급이나 장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든지, 아니면 나라 안팎에서 크게 인정 받는 석학을 모시든지 해야 합니다."
◆대공황과 스푸트니크 쇼크 = 지금 우리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들 분석한다. 부동산 침체에 수출은 안 되고, 정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남 회장은 미국 도서관의 부흥기를 보라고 말했다. 위기를 헤쳐나가는 미 정부의 전략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 정부가 택한 방법은 바로 도서관 진흥이었다. 대표적 두 사례가 바로 1930년대 대공황과 1957년 스푸트니크 쇼크다.
"대공황때 미국에 실업자가 양산됐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역경을 딛기 위해 도서관으로 모였고, 이를 본 미 정부는 예산을 대폭 늘려 도서관을 짓고, 질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지식을 얻고,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이 희망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민은 대공황을 극복해 냈습니다."
북핵으로 인해 안보 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는 현 상황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선례를 보면 된다. 1957년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미국 내 안보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미 정부가 택한 방법은 바로 학교도서관 진흥이었다. 미국 내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이어졌고, 곧바로 교육 현장이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행정 체제와 법제 정비에 돌입했다. 바로 '스푸트니크 쇼크'의 시작이다. 이듬해인 1958년 미국은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학교도서관을 위한 연방자금 지원 근거 마련 등에 나섰다.
"빌 게이츠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바로 내가 살던 마을의 공공도서관'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없는 까닭을 반드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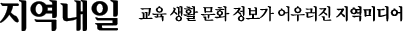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