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엄대섭 평전 쓴 이용남 전 한성대 총장
"우리나라에 작은도서관 운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다. 공공도서관의 씨앗이 됐던 게 문고설립운동, 즉 작은도서관 설립이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선 지 10년도 지난 지금 다시 작은도서관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가는 건 역사적 아이러니다."
도서관운동가 엄대섭 평전 '이런 사람 있었네'를 집필한 한성대학교 전 총장 이용남 선생은 "민간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취지는 갸륵하나 정부가 공적자금을 부어 이를 설립하는 건 임무와 역할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이 선생이 예를 든 것은 뉴욕의 도서관. 공식적으로 뉴욕의 도서관은 1개에 불과하다. 뉴욕에 산재한 나머지 60개 작은도서관은 뉴욕중앙도서관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분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도서관 없던 200, 300년 전에 짓던 게 바로 작은도서관이다. 이후 20세기를 전후해 '이란성 쌍둥이'인 무상교육과 공공도서관 개념이 생겨났다. 민주주의를 교육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이 생겨나면서 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삼는 시스템일원화를 갖춰 나가게 됐다.
이 선생은 "우리 정부가 양적 성과주의에 빠져 도서관 숫자 늘리기 놀음을 하고 있다"며 "정식 사서직원을 둘 필요도, 양질의 도서를 구비할 책임도 없는 작은도서관을 자꾸 만드는 것은 60~70년대 마을문고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과 다름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선생이 제시하는 대안은 민간에서 만든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흡수하는 것이다.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선생은 "새마을문고 역시 공공도서관과 한 시스템으로 돌려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작은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 정책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의 인식 수준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선호 프로그램 1위가 영어강좌, 2위가 논술쓰기 강좌라는 현실은 공공도서관을 아직도 공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이 선생의 마지막 말에는 간곡한 바람이 담겨 있다.
"시민이 이성적이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그걸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려면 공공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스스로 탐구하고 자기 성찰의 질문을 던지는 곳, 연구를 위한 곳입니다. 시민이 성숙한 사회, 즉 민주주의 사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시민이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우리나라에 작은도서관 운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다. 공공도서관의 씨앗이 됐던 게 문고설립운동, 즉 작은도서관 설립이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선 지 10년도 지난 지금 다시 작은도서관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가는 건 역사적 아이러니다."
도서관운동가 엄대섭 평전 '이런 사람 있었네'를 집필한 한성대학교 전 총장 이용남 선생은 "민간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취지는 갸륵하나 정부가 공적자금을 부어 이를 설립하는 건 임무와 역할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이 선생이 예를 든 것은 뉴욕의 도서관. 공식적으로 뉴욕의 도서관은 1개에 불과하다. 뉴욕에 산재한 나머지 60개 작은도서관은 뉴욕중앙도서관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분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도서관 없던 200, 300년 전에 짓던 게 바로 작은도서관이다. 이후 20세기를 전후해 '이란성 쌍둥이'인 무상교육과 공공도서관 개념이 생겨났다. 민주주의를 교육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이 생겨나면서 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삼는 시스템일원화를 갖춰 나가게 됐다.
이 선생은 "우리 정부가 양적 성과주의에 빠져 도서관 숫자 늘리기 놀음을 하고 있다"며 "정식 사서직원을 둘 필요도, 양질의 도서를 구비할 책임도 없는 작은도서관을 자꾸 만드는 것은 60~70년대 마을문고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과 다름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선생이 제시하는 대안은 민간에서 만든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흡수하는 것이다.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선생은 "새마을문고 역시 공공도서관과 한 시스템으로 돌려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작은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 정책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의 인식 수준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선호 프로그램 1위가 영어강좌, 2위가 논술쓰기 강좌라는 현실은 공공도서관을 아직도 공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이 선생의 마지막 말에는 간곡한 바람이 담겨 있다.
"시민이 이성적이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그걸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려면 공공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스스로 탐구하고 자기 성찰의 질문을 던지는 곳, 연구를 위한 곳입니다. 시민이 성숙한 사회, 즉 민주주의 사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시민이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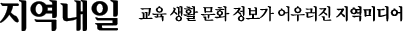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