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노는땅'에 주민편의시설 들어서
쉼터·도시텃밭에 도서관·보육시설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자치회관 1층에 30일 북카페가 문을 연다. 치안센터가 사용하던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 이용자들이 자유롭고 유쾌하며 다양한 문화적 소통을 하라는 의미에서 '자유다'라고 이름 붙였다. 구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공무원들이 주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주민 요구나 문제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산 아끼고 주민은 편하게 = 서울 자치구가 오랫동안 비어있거나 방치돼있던 땅이나 사무실 등 자투리공간을 주민시설로 꾸미고 있다. 큰돈을 들여 새 시설을 짓기보다 틈새로 눈을 돌려 예산을 아끼면서 편의·복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다.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찻집이 그 중 하나. 성북구는 지난 연말 삼선동1가 재개발지역인 장수마을에 카페를 열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있던 집을 꾸민 44㎡ 규모 공간이다. 차와 음료를 파는 주민들 사랑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건물주 허락을 받았다.
서초구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구청 1층에 커피전문점을 개설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있던 사각지대가 45.8㎡ 규모 가게로 변신한 것. 구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양성한 바리스타를 고용하도록 운영업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지난해 2월 자양3동주민센터 복도에 탁자와 의자, 작은 서가를 들여놓고 '휴(休)카페'로 개조했다.

송파구는 신천동 빗물펌프장 내 노는 공간을 수선해 '송파어린이 영어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도서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책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 송파구 제공
송파와 마포는 공공·민간시설에서 자투리공간을 찾아내 작은도서관으로 꾸몄다. 지난 연말 송파구 잠실동과 신천동에 문을 연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과 '송파어린이 영어작은도서관'은 빗물펌프장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한 시설. 펌프장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발굴해내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아끼면서 인근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멀리 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지난달 문을 연 마포구 성산동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은 방치돼있던 시영아파트 부속건물을 재단장한 곳이다. 주민들이 건물을 공공도서관 용도로 내놨고 구는 기업 도움을 받아 대수선을 했다.
도봉과 종로는 '노는 땅'을 도시텃밭으로 바꿨다. 도봉구는 건축허가가 난 뒤에 장기간 방치돼있던 쌍문동 3필지에 친환경 나눔텃밭 373구획을 조성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소유한 땅 7176㎡에서 주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한다. 이호정 구 환경정책과 주무관은 "세대간 주민간 소통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며 "올해는 보육시설이나 복지관 등 공공시설 79곳에 옥상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주택가 자투리공간에 도시텃밭을 만들었다. 창신동 평창동 옥인동 등 지역 곳곳에 있는 시유지나 사유지 등이 오랫동안 방치,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질되자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배추 등 채소를 심었다. 운영은 인근 주민단체나 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맡겼다. 지난 연말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와 무 등으로 김장을 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기도 했다.
◆활용도 떨어지는 공간 재배치 = 강남과 구로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이 보육시설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강남구는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에서 특히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재배치, 부족한 공공보육시설을 확보했다. 대수선에 쓴 비용은 6억원. 반면 정원 100명인 시설 하나를 짓기 위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146억원 가량이 든다.
구로구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대림역을 잇는 다리 아래쪽을 문화공간으로 바꿔냈다. 별달리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단순히 자재창고로만 쓰고 있던 공간을 새로 단장했더니 300㎡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구는 '구로노리단 창작발전소'로 이름 짓고 공연·연습실과 사무실 등을 배치한 뒤 지역 내 사회적기업인 '노리단'이 입주하도록 했다. 노리단은 이곳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워크숍 등을 기획한다.
버려진 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바꿔낸 흐름에 대한 내부 평가는 긍정적이다. 황채연 서초구 총무과 주무관은 "행정기관에서 주민친화적인 서비스를 강조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쉼터·도시텃밭에 도서관·보육시설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자치회관 1층에 30일 북카페가 문을 연다. 치안센터가 사용하던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 이용자들이 자유롭고 유쾌하며 다양한 문화적 소통을 하라는 의미에서 '자유다'라고 이름 붙였다. 구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공무원들이 주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주민 요구나 문제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산 아끼고 주민은 편하게 = 서울 자치구가 오랫동안 비어있거나 방치돼있던 땅이나 사무실 등 자투리공간을 주민시설로 꾸미고 있다. 큰돈을 들여 새 시설을 짓기보다 틈새로 눈을 돌려 예산을 아끼면서 편의·복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다.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찻집이 그 중 하나. 성북구는 지난 연말 삼선동1가 재개발지역인 장수마을에 카페를 열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있던 집을 꾸민 44㎡ 규모 공간이다. 차와 음료를 파는 주민들 사랑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건물주 허락을 받았다.
서초구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구청 1층에 커피전문점을 개설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있던 사각지대가 45.8㎡ 규모 가게로 변신한 것. 구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양성한 바리스타를 고용하도록 운영업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지난해 2월 자양3동주민센터 복도에 탁자와 의자, 작은 서가를 들여놓고 '휴(休)카페'로 개조했다.

송파구는 신천동 빗물펌프장 내 노는 공간을 수선해 '송파어린이 영어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도서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책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 송파구 제공
송파와 마포는 공공·민간시설에서 자투리공간을 찾아내 작은도서관으로 꾸몄다. 지난 연말 송파구 잠실동과 신천동에 문을 연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과 '송파어린이 영어작은도서관'은 빗물펌프장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한 시설. 펌프장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발굴해내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아끼면서 인근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멀리 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지난달 문을 연 마포구 성산동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은 방치돼있던 시영아파트 부속건물을 재단장한 곳이다. 주민들이 건물을 공공도서관 용도로 내놨고 구는 기업 도움을 받아 대수선을 했다.
도봉과 종로는 '노는 땅'을 도시텃밭으로 바꿨다. 도봉구는 건축허가가 난 뒤에 장기간 방치돼있던 쌍문동 3필지에 친환경 나눔텃밭 373구획을 조성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소유한 땅 7176㎡에서 주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한다. 이호정 구 환경정책과 주무관은 "세대간 주민간 소통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며 "올해는 보육시설이나 복지관 등 공공시설 79곳에 옥상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주택가 자투리공간에 도시텃밭을 만들었다. 창신동 평창동 옥인동 등 지역 곳곳에 있는 시유지나 사유지 등이 오랫동안 방치,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질되자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배추 등 채소를 심었다. 운영은 인근 주민단체나 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맡겼다. 지난 연말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와 무 등으로 김장을 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기도 했다.
◆활용도 떨어지는 공간 재배치 = 강남과 구로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이 보육시설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강남구는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에서 특히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재배치, 부족한 공공보육시설을 확보했다. 대수선에 쓴 비용은 6억원. 반면 정원 100명인 시설 하나를 짓기 위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146억원 가량이 든다.
구로구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대림역을 잇는 다리 아래쪽을 문화공간으로 바꿔냈다. 별달리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단순히 자재창고로만 쓰고 있던 공간을 새로 단장했더니 300㎡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구는 '구로노리단 창작발전소'로 이름 짓고 공연·연습실과 사무실 등을 배치한 뒤 지역 내 사회적기업인 '노리단'이 입주하도록 했다. 노리단은 이곳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워크숍 등을 기획한다.
버려진 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바꿔낸 흐름에 대한 내부 평가는 긍정적이다. 황채연 서초구 총무과 주무관은 "행정기관에서 주민친화적인 서비스를 강조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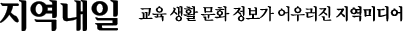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