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사람들 - 경기국제통상고 김혜정 교사
“세종대왕님 죄송해요. 애들이 욕을 많이 해서요.”
욕설, 속어, 은어, 일상 언어 지도 필요 … 긍정적 신조어는 창의력의 산물

“욕한다고 외면하고 혀를 차기에 앞서 아이들 언어에 관심이 필요해요. 들여다보면 재미있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언어들도 여럿 있어요. 또 신조어는 청소년 문화 현장이죠. 발을 담가보면 소통의 즐거움과 유대감 형성이란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될 테니까요.”
아직 여물지도 않은 얼굴로 유창한 욕을 구사하는 아이들
김혜정 교사는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다. 2010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 청소년 저작상 수상작 ‘복어가 배를 부풀리는 까닭은’, ‘바람의 집’, ‘독립 명랑 소녀’ 등이 그의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그의 시선은 늘 아이들 정서와 가깝다.
“옛날에는 불량학생들이나 욕을 했잖아요. 요즘은 달라요. 욕하는 습관은 성적과 무관하고 인성과도 또 다른 차원예요. 일종의 청소년 신종 문화라고나 할까요. 그 일상적인 욕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까지 무색하게 만들죠.”
김 교사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욕으로 존나(매우), 쩐다(‘매우 대단하다’의 의미로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에 두루 쓰임), 캐안습(가관이다), 삽질하다(헛고생하다), 센터까다(가방 검사를 하다), 야리까다(담배를 피우다), 뽀리까다(훔치다), 다구리(뭇매/집단 구타), 까대기(이성 친구를 유혹하는 것) 등을 든다.
여기에 애자(장애인에 비유)등 자신의 화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폭력적 언어도 뒤따른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욕 문화. 부모들은 그러다가 말겠지 하다가도 습관들일까봐 걱정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
휴대폰 문화가 생산한 통신언어 - 동질감과 유대강화, 심리적 해방동기
“아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욕을 해요. 자신도 모르게 입에 욕이 밴 것이지요.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의식중에 일부 의식 속에서 밀어낸 결과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일종의 모방욕구도 있어요.”
김 교사는 아이들의 욕 문화를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또래 집단과의 정서적 유대감표현이라고 해석한다. 게다가 스트레스 해소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욕은 시달리는 입시 중압감과 결핍된 불안한 심리상태의 반영이죠. 여기에 컴퓨터와 인터넷은 신조어까지 양산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은 신속하고 급격하게 욕과 신조어를 퍼 나르는 역할을 맡죠.”
이뭐병(이거 뭐 병신도 아니고),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갠소(개인소장), 아웃오브안중(관심이 없다), 빠이염(헤어질 때 인사), 레알(영어의 Real을 그대로 읽은 말로 의미를 강조할 때 쓰임) 등의 신조어들은 휴대폰 사용 영향과도 뗄 수 없는 관계다.
“신조어들은 줄임말 형태를 띠죠.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등 제한된 바이트(byte) 내에 많은 표현을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축약어를 만들어 냈어요. 청소년의 욕이 부정적이라면 신종어는 일종의 창의력의 산물이죠. 양자 모두 사회 흐름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영어경진대회는 많고 우리말대회는 없다
인간의 기본본능 중 하나는 간편함의 추구. 특히 청소년 시기는 강한 창조 욕구를 발산하는 시기다. 그래서 그들의 신조어 제조는 언어파괴란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언어창조의 편리함과 잠재력을 거침없이 발휘하는 긍정성도 함께 지닌다.
욕과 신조어가 생성-진화-소멸의 단계를 거치는 사회발전과정 중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지만 청소년들의 취약한 언어구조는 분명한 현실이다. 가령 우리말을 적절히 사용한 의사표현법은 점점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어른들의 욕 문화습관도 보태진다. 청소년들은 부모 외에도 방송매체와 인터넷 등에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속어와 폭력적인 용어를 손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영어경진대회는 많지만 순우리말 경진대회가 거의 없는 부끄러운 실정이 우리말의 현주소”라며 “청소년들의 바른말 사용을 위해서는 언어와 인성교육은 물론 아름다운 우리말로 쓰여진 문학작품을 읽도록 독려하고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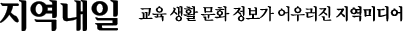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