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을 전공하면 돈이 많이 든다?
무용과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 위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런 관점에서 보통 인문 계열로 비슷한 수준에 대학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의 일반적인 사교육비 보다 적게 든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력에 따라 렛슨비가 틀려 지지만 대부분의 예술고등학교의 전공 렛슨비(개인 렛슨비 포함)를 교육청에서 감사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선생님과 렛슨비라면 충분히 신뢰 할 수 있고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로 작품비와 의상비인데요. 의상비는 의상실 별로 100만원 정도에서~300만원 이상 되는 의상까지 상대적으로 고가 이지만 대입을 치를 때 의상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단 수시가 있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의상을 구입해야 하지만 근래에는 의상대여 또한 보편화 되어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작품비 또한 정말 선생님의 경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각 예술고등학교 마다 정해져 있는 작품비가 있으며 그 정도 수준의 작품비 라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체계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10세에 시작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개개인에 수준 별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기본기를 익히지 못하거나 잘못배운 경우 또한 근육 형성이 잘못된 경우는 오히려 경력이 많은 부분이 치명적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초보자들을 2, 3년 동안 교육 시켜서 서울, 수도권내 명문대에 무난히 합격 시켰습니다.
물론 누구나 2, 3년만 하면 입시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구나 무용을 전공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용을 전공 하려면 어느 정도로 무용에 적합한 신체적 관절 모양과 신체적 비율, 예술적 감성, 음악성, 유연성이 필요 합니다. 이중 대부분은 잘 맞춰진 트레이닝을 통해 극복 할수 있지만 관절 모양이 유난히 비뚤어 진 경우는 아주 큰 핸디캡이 되며 전공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 할수 있으며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용 전공자들은 졸업 후 진로가 제한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직업 무용수나 교수, 교사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다른 타 전공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리는 경우가 드문 경우이다. 오히려 무용과 출신의 직업 선택은 훨씬 광범히 하게 분포 되어 있다.
제가 아는 사람들로만 알려드리자면 대학 및 예술중·고 강사, 안무가, 학원, 무대연출, 조명 아티스트, 일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비디오 아티스트, 의상, 극장 매니저, 아나운서, 배우, 가수, 모델, 메이컵 아트스트, 뮤지컬 배우, 승무원, 필라테스, 요가, 스포츠 댄스까지 굉장히 다양하다.
무용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그 재능을 표출하며 예술적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에 메여 사는 것보다 다양한 예술적 문화를 접하고 대부분 대학의 무용과 입시에 반영되는 수능(언어, 외국어, 사탐), 학생부(국어, 영어, 과학, 사회)정도의 효율적인 성적 관리만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무용과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용과 입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평균적으로 실기 50%, 수능+학생부 50% 정도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수능과 학생부 또한 학교별로 반영되는 과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 가능한 학교별로 묵어 일찍히 개별적 입시전략이 필요하며 그 전략에 따라 학교별 작품 선택과 실기 과제물의 분석, 준비하는 과정 또한 주요한 부분입니다. 무용과 입시에 특징 중 하나가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에 단락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런한 요소 하나 하나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용교육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씁드렸듯이 다양한 입학시험 기준 가운데 작품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무용 입시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작품의 수준에 따라 비슷한 기량에 무용수들에게 얼마나 다른 평가가 주워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용 교육은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발레단에 한국 무용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며 세계3대 발레 콩쿠르에서도 놀랄만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무용교육에 전체적인 발전 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에 강사들을 보유한 선화예중 출신에 강효정(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무용수), 월드 발레리나 강수진 씨, 스위스 바젤 발레단의 원진영 씨, 미국 애틀란타 발레단의 김유미 씨,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에 발레리나 김세연 씨(31) 드레스덴젬퍼오퍼발레단 발레리나 이상은 씨,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솔로이스트로 승급한 서희 씨 또 올 초 스위스 로잔발레콩쿠르에서 한국 발레리노로는 처음 입상하며 영국 로열발레단 연수단원으로 입단한 한성우 씨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 강예나 씨,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김주원 씨가 선화예중,고 출신 무용수들이다. 물론 발레에 적합한 신체조건에 일찍 무용을 시작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진보된 기본기와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발레는 굉장히 섬세한 예술 분야이며 꾸준한 개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잘못 습득한 버릇이나 잘못된 근육 형성은 정말 고치기가 힘듭니다.
처음 배울 때가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은 이 분야에 정설입니다.
끝으로 미래에 우리나라 무용계를 이끌어 나아갈 무용학도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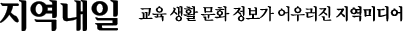






 목록
목록



 보내기
보내기